보통 ‘감수성’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문학적 감수성을 상상하는 것 같다.
감수성은 당송팔대가 중 한 명인 구양수(歐陽脩, 1007~1072)가 ‘글 잘 쓰는 방법’이라고 말한 다독(多讀), 다작(多作), 다상량(多商量)을 기본으로 한다. 많이 읽고, 많이 쓰고, 많이 생각해 다른 사람을 공감하고 그 마음을 자신의 스타일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문학적 감수성의 요체다.
남자 어른이 순정만화를 읽고 눈물을 흘리는 TV광고가 예전에 있었는데 나는 그 모습에서 감수성이 풍부한 한 사람의 모습을 찾았다. “문학이란 정(情)의 분자”라고 했던 한 작가를 떠올리며.
이공계 특성화 대학에서 문학을 가르치면서 문학적 감수성과는 다른 공학적 감수성이 있는지 생각하게 됐다. 처음엔 감수성은 인문학의 영역이라고 생각했다. 그도 그럴 것이 학생들은 “제가 공대에 있어서 잘 모르는데…….”라는 식의 양해를 구하는 톤으로 주인공이 생각한 바나 줄거리의 구조, 인물 사이의 관계 등을 물어봤기 때문이다. 순정만화를 읽으면서 눈물 짓던 그 TV광고를 상상하며 인문학적 감수성이 메마른 공학도들에게 문학의 단비를 뿌려주겠다는 생각도 했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러한 이분법적 사고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수업시간에 창의적인 팀 프로젝트를 도입한 뒤부터였다.
학생들은 확실히 글쓰기를 버거워했다.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명쾌하게 풀어내는 학생은 많지 않았다. 그렇다고 해도 학생들에게 감상 자체가 없다고는 상상하기 어려웠다. 그래서 기말 감상문을 대체할 팀 프로젝트를 도입했는데, 그것은 기존 작품을 읽고 느낀 감상을 한 작품으로 만들어내는 것이었다. 시, 소설, 연극, 뮤지컬, 웹툰, 애니메이션 등 표현방식은 무엇이든 좋지만, 그 안에 서사(기승전결의 이야기)와 학생들 자신의 메시지를 넣는 것이 조건이었다.
기말 프로젝트를 통해서 나를 울린 작품들은 부지기수로 많다. ‘박하사탕’을 다룬 작품에서는 영화에서 크게 다루지 않았던 순임의 시각을 통해 시대의 광기와 폭력에 물들어 자신의 길을 잃어버린 영호를 이해하는 따뜻함을 보았다. 세월호를 다룬 박민규의 에세이를 읽은 학생들은, 전원구조가 돼 가족들과 화목하게 식사하는 장면을 상상했는데 그렇게 살아 돌아온 단원고 학생들이 모두 가족을 찾는 어린 영혼이었음을 알았을 때 가슴 속에서 서늘하게 올라오던 격한 복받침은 잊을 수 없다. 이같은 예는 아마 인문학적 감수성이 뛰어난 공학도들의 경우라고 봐도 좋을 것 같다.
그들의 프로젝트 중 ‘이런 것이 공학적 감수성이구나’ 하고 느낀 작품이 하나 있었다.
한 학생이 상담시간에 서사 없이 새로운 것을 만들어도 좋은가 하고 물었다. 서적 추천 앱을 만들고 싶단다. 온라인 서점에서 쓰는 책 추천은 같은 책을 산 사람이 구매한 다른 책을 추천하는 시스템이다. 자녀를 위해 구입한 동화가 있다면 그 역시 추천될 수도 있다. 이 팀의 제안은 학교 온라인 학습 플랫폼을 활용해 학생들이 올려놓은 토론 주제와 키워드를 텍스트 마이닝으로 분석해 그 주제와 키워드에 관심 있는 사람이 구입한 다른 책을 추천하는 방식이었다. 물론 글을 쓴 사람들의 공동체가 온라인에 있고, 그들의 언어를 분석하는 조건이 있긴 하지만 기존의 책 추천과는 차별되는 아이디어였다.
이후 그 학생들은 자신의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창업까지 해 버렸다. 글 쓰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온라인에 구축한 것이다. 글쓰기에 관심이 많지만 엄두가 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음을 간파한 학생들은 글감을 주고 편하게 글을 쓸 수 있는 앱을 개발했다. 이들이 개발한 ‘씀 : 일상적 글쓰기’라는 앱은 ‘구글 플레이 2016년 올해를 빛낸 가장 아름다운 앱’ 중 하나가 됐다.
과학기술에 대한 예민한 감각을 활용해 사람들의 일상적 관계와 지적 교류의 플랫폼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공학적 감수성’이라고 한다면 나는 그 학생들에게서 발견한 것 같다. 이들의 앱을 통해 문학상이 열리고 작가로 등단하는 문인들이 나오길 기대해 본다.
이재연 UNIST 기초과정부 교수
<본 칼럼은 2018년 3월 6일 울산매일신문 17면에 ‘[현장소리 칼럼] ‘공학적 감수성’이 뭔가요?’이라는 제목으로 실린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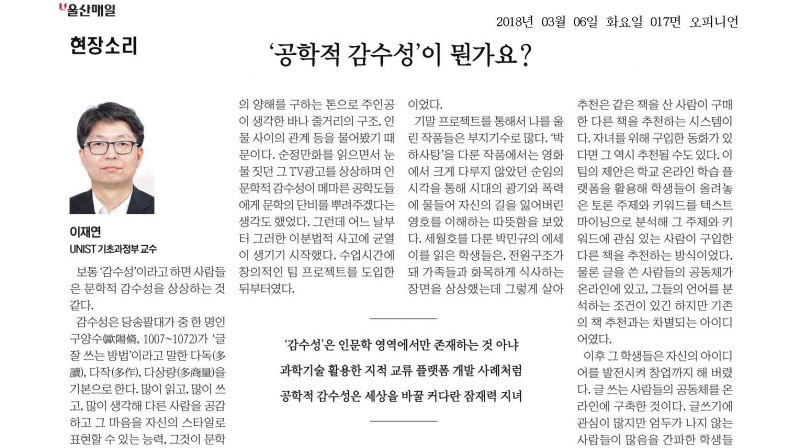





![[매일시론] 플라스틱 비즈니스 모델](https://news.unist.ac.kr/kor/wp-content/uploads/2026/03/썸네일플라스틱-비즈니스-모델-190x122.png)

![[배성철 칼럼]‘AI 의사’의 습격인가, 의료 혁명의 서막인가](https://news.unist.ac.kr/kor/wp-content/uploads/2026/02/AI-doc-190x12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