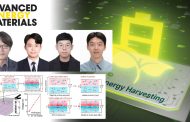올해 1월 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2015)의 화두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웨어러블(입을 수 있는) PC’였다. 그런데 한 가지 달라진 점이 있었다. 웨어러블이 ‘전신’으로 확장된 것. 벨트나 양말 등 몸에 착용하는 모든 제품이 웨어러블로 변신했다. 이제 웨어러블도 편안해야 성공한다.
기술보다 ‘착용감’
“웨어러블 제품 중에 가장 인기가 많은 것이 구글글래스죠. 하지만 한 가지 큰 단점이 있습니다. 안경 렌즈에 달린 디스플레이가 어색하게 보인다는 거죠.” 박장웅 UNIST 신소재공학부 교수는 웨어러블 제품의 성공 여부는 ‘기술력’보다는 ‘착용감’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앞으로는 눈에 띄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지난해 10월 피부에 붙여도 티 나지 않는 투명한 ‘전자피부’를 개발해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인듐주석산화물(ITO)이라는 재료로 만든 기존 투명 전극은 유리처럼 쉽게 깨져 피부에 붙일 수 없었다. 연구팀은 그래핀과 금속섬유라는 완전히 새로운 두 재료를 결합해 문제를 해결했다. 벌집 모양의 그래핀 사이사이에 길게 늘인 금속 섬유를 연결한 것. 이렇게 만든 복합체는 셀로판테이프처럼 투명하고 얇은 데다 기존의 투명 전극보다 저항값이 250배나 낮았다. 앞으로 전자피부를 포함해 자연스러운 웨어러블 제품을 만드는 데 이용될 전망이다. 이 결과는 권위 있는 국제학술지 ‘나노 레터스’에 실렸다.
거미줄에서 얻은 힌트
연구팀은 첫 아이디어를 ‘거미줄’에서 얻었다. 거미줄은 너무 가늘어서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 박 교수는 금속도 충분히 가늘게 만들면 투명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다. 바로 방직기와 원리가 유사한 전기방사기를 이용해 두께가 500nm(10억분의 1m)로 얇은 금속 나노선을 뽑아 투명 전극을 만들었다. 웨어러블 제품에 적용하려면 전극의 탄력도 좋아야 했다. 그동안 개발된 스프링 구조의 전극 소재는 너무 두꺼워서 빛 투과율이 좋지 않았다. 연구팀은 거미줄을 본 딴 평평한 그물구조의 소재를 만들었다. 신축성과 투명성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은 셈이다.
“투명 전극, 2년 뒤 상용화 할 것”
투명 전극은 웨어러블 제품은 물론이고, 동물 피부나 유리, 나뭇잎 등에 붙여 센서로 활용할 수 있다. 인간이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의 온도나 습도를 측정하거나, 유독가스나 방사능에 오염된 지역에서 유해 물질을 감지하는 식이다. 박 교수는 “2년 내 상용화하는 것을 목표로 샘플 크기를 키우는 데 주력하고 있다”며 “중국에서 독점하고 있는 인듐산화물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비용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책 보다 실험’
박장웅 교수의 연구 철학은 ‘책 보다 실험’이다. 미국 유학시절 연구실 동료가 허름한 차고에서 잡동사니를 끌어다 여러 가지 실험을 하는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은 뒤부터다. 박 교수가 이끄는 연구실의 성과도 유독 실험에서 많이 나왔다. 2011년 학부 2학년 시절부터 박 교수와 실험을 함께 해온 안병완 석박사통합과정 학생은 “투명한 전극을 만들기 위해서는 매우 까다로운 공정을 거쳐야 한다”며 “실험을 통해 체득한 지식이 전극을 실제로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또 하나 강조하는 것은 ‘속도’다. 웨어러블 장비 분야의 경쟁이 워낙 치열해 결과가 조금만 늦어도 다른 팀에게 아이디어를 뺏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안 연구원은 보통 1년 정도 걸리는 논문 작업을 실험을 통해 6개월 만에 마무리했다. UNIST가 보유한 풍부한 첨단실험 장비도 ‘속도전’에 보탬이 됐다. 박 교수는 “고가의 실험 장비가 한 곳에 모여 있는 대학교는 흔치 않다”며 “실험을 좋아하고 많이 할 준비가 된 학생들이 투명 전극 연구를 이끌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혜 과학동아 기자 | yhlee@donga.com
<본 기사는 2015년 2월 ‘과학동아’에 ‘투명하고 안전한 전자피부’라는 제목으로 실린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