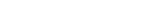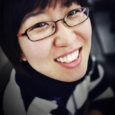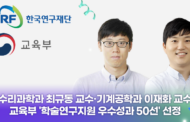뜬금없이 로켓을 날려본다.
– 뉴턴 제3법칙. 작용/반작용의 법칙. 모든 작용에 대해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인 반작용이 존재한다. 로켓은 연료를 아래로 분사하고 (작용), 추진력을 얻어 위로 날아간다 (반작용).
– 뉴턴 제1법칙. 관성의 법칙. 외부에서 힘을 가하지 않는 한 물체의 움직임은 변하지 않는다. 한번의 추진력으로 발사된 로켓은 외부 저항이 없다면 추가적인 추진력 없이 무한히 날아간다.
태초의 대폭발에 의해 추진력을 얻은 ‘시간’이라는 로켓은 그렇게 날고 있다. 시간여행자가 아닌 이상 시간의 관성에 영향을 줄 방도는 없다. 그러나 차디찬 ‘시간’을 좀 더 인간적 단어인 ‘역사’로 해석한다면 우리의 의지가 개입될 여지가 조금은 있어 보이지 않는가? 역사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한다는 진보적 사관은 르네상스 말기에 시작돼 18세기에 이르러서 정립됐다.
이전의 역사는 시간의 관성적 흐름에 열거된 사건들의 단순 나열로서 방향성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혹은 아담과 이브의 잃어버린 낙원 또는 요순시대로의 회귀와 같은 순환적 방향성을 가지고 있었다. 진보적 사관은 18세기 서구 계몽사상가의 인간에 대한 낙천적 믿음에서 비롯됐다. 진보의 본질 중 하나는 변화인데, 이는 고대 그리스 자연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의 “모든 것이 흐른다”에 그 전제를 뒀다고도 할 수 있다. 불합리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역사가 발전한다면, 불합리성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질문에 답하고자 역사가들은 역사 진보의 과학적 원리를 밝히고자 노력했다.
‘역사를 과학적으로 이해하기’ 시작은 19세기 프랑스 실증주의 철학자 콩트나 혹은 그 근처 어디즈음에서 출발한다. 그에 따르면, 인간의 지식은 신학적 단계, 형이상학적 단계, 실증적 단계의 순차적 세 단계로 발전한다. 또한 과학에는 위계질서가 있어, 총체적 성격의 상부 과학은 기초적 하부 과학의 발전을 통해 진보한다. 이상적인 상태에서 물리학의 법칙이 적용되는 천문학이 가장 하부 과학이므로 가장 빨리 신학적, 형이상학적 단계를 벗어나 실증적 단계에 이르렀고, 뒤따라 물리학과 화학이, 이후 유기체에 관한 학문인 생물학과 생리학이 그 마지막 단계에 이른다. 사회학은 생물학적 유기체를 근간으로 한 사회적 유기체에 대한 학문이므로 가장 늦게 실증적 단계에 도달한다.
독일의 철학자 헤겔과 마르크스는 변증법적 방법론을 운용해 역사 발전의 법칙을 제시했다. 변증법은 현 상태 (또는 자신)에 대한 긍정과 이에 대한 부정을 거쳐 한 차원 높게 발전된 상태의 긍정에 이르게 되는 논리학적 원리이다.
헤겔은 역사의 주체를 이성 (reason)으로 보았고, 역사는 자유가 확장되는 방향으로 발전한다고 주장했다. 헤겔은 자유 확장의 관점에서 전제주의 (고대 중국), 지방분권적 전제주의 (페르시아), 제한적 민주주의 (고대 그리스 로마) 그리고 자신이 살았던 프로이센의 민주주의를 순차적 역사진보의 예로 들었다. 마르크스는 역사 진보의 원동력을 생산력과 생산관계 (혹은 생산관계의 법률적 표현인 소유관계)의 모순으로 보았다. 역사는 이 모순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발전하며, 그의 저작인 <정치경제학의 비판을 위하여>에서 “아시아적, 고대적, 봉건적, 그리고 현대 자본주의적 생산양식들은 경제적 사회구성체의 순차적인 시기들”이라고 말했다. 헤겔의 역사 진보 방향이 “좀 더 많은 이들에게 사회적 자유를”이라면 마르크스적 방향은 “좀 더 많은 이들에게 경제적 자유를”이라고 해석하면 무리일까?
역사의 진보는 필연적이고 그 진보에 방향성이 있다면, 국지적인 역방향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결국 강은 바다에 다다를 것이다. 결국 그렇게 될 진대, 인간의 자유의지는 역사에 관여할 수 없는가? 헤겔식으로 말하자면 그 열역학적 종착점 역시 인간 정신의 반영이다. 역사 곳곳에서 발견되는 질곡의 역방향적 흐름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뒷받침 한다. 1789년 왕정을 공화정으로 바꾼 프랑스대혁명은 결국 1804년 나폴레옹의 제정으로 역변됐고, 1960년 이승만 정권의 독재와 부정을 몰아낸 419 혁명은 1961년 박정희 소장의 516 군사 쿠데타에 의해 독재의 회귀로 막을 내렸다.
촛불혁명을 바라보며, 좋은 것들을 상상한다. 적극적 시민 참여 민주주의, 권력이 효과적으로 견제되는 나라, 직업이 내 존재를 정의하지 않는 나라, 절차에 있어 합리적이며 공정한 사회, 다양한 꿈을 꿀 수 있어, 다단계적 우월의식과 열등의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나라, 그리하여 내 아이가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나라. 조금 더 그 곳으로 빨리 가고 싶은 나의 조급함이 정방향의 역사흐름을 막아 설 수 있는 역방향적 현상을 경계하게 만든다. 다시 뉴턴식으로 말하건대, 소수의 정치적 경제적 기득권의 ‘작용’으로 추진력을 얻은 로켓은 국민의 ‘반작용’에 의해 기존의 관성을 버리고 수준 높은 형태의 관성으로 진화하리라.
송현곤 UNIST 에너지 및 화학공학부 교수
<본 칼럼은 2017년 4월 5일 울산매일신문 16면에 ‘[시론 칼럼] 뉴턴식 역사 읽기’이라는 제목으로 실린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