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 부동산이 결합해 생겨난 서울의 강남이란 이제 소위 ‘8학군’을 넘어선 위세를 상징하게 됐다. 언론은 연예인과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대박’을 반복해서 보여주며, “성공하려면 저기까지 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부지불식간에 주입하고, ‘영끌’을 해서 두 세배의 차익을 얻은 영리한 투자자를 칭송한다. 이토록 익숙한 문장에 우리는 점점 무감각해지고 있다.
이런 풍경 한복판에, 교육부 장관 후보는 “서울대를 열 개 만들겠다”는 구상을 내놓았다는 소식이 들린다. 공정한 기회, 지역 균형 발전, 수도권 쏠림 해소가 그 취지라고 한다. 그런데 필자의 눈에 먼저 들어온 건 ‘열 개’ 보다는 ‘서울대’였다. 물론 실제로 지방 국립대를 더 육성하겠다는 내용일 것이다. 그래도 소위 교육 정책이 굳이 ‘서울대’라는 브랜드에 기대어, 그 브랜드의 복제를 선언하는 메세지라니.
우리는 이미 이 ‘공정’이라는 말장난을 어디선가 본 적이 있다.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은 그런 세계를 상징적으로 묘사한다. 모두가 같은 트레이닝복을 입고, 같은 룰 아래 경쟁하는 구조는 얼핏 공정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룰을 설계한 자들에게 유리하게 짜인 게임이다. 공정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그 세계는, 끝내 누군가의 탈락을 통해서만 한 사람이 살아남는 구조를 감추고 있다.
‘서울대 열 개 만들기’도 비슷하다. 이름은 거창하지만, 정작 결말은 여전히 강남, 서울대라는 브랜드에 매달리며 누군가가 탈락될 가능성이 크다. 행동경제학에서 말하는 ‘상대적 박탈감’은 우리 사회의 경쟁을 설명하는 데 유효하다. 인간은 절대적 조건이 아니라 타인과의 비교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욕망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가령, 서울 아파트와 지방 아파트의 가격의 격차가 중요하지, 실제 가격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서울대가 열 개 생긴다고 해서 경쟁이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다. 한국인들에게 서울대란 위세와 권력을 상징한다. 그것을 획득하면 가족의 헌신은 보상받고, 사회적 지위는 보증된다. 서울대가 하나의 교육기관을 넘어서, ‘환전소’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고등학교가 지역마다 서열화돼 있고, 사교육 시장은 수도권에 집중돼 있으며, 대학 졸업장의 가치는 다시 ‘원조 서울대’로 회귀할 것이다. 서울대가 열 개 생겨도 사람들은 이 질문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요즘 부동산 관련 용어를 빌자면) “‘상급지’ 서울대는 어디냐”고.
그런데 서울대가 온 국민이 떠받드는 ‘브랜드’ 외에 과연 어떤 가치를 지니는지에 의문이 든다. 최근 영국 글로벌 대학 평가 기관 QS가 발표한 ‘2025 세계대학평가’에서 한국 대학은 상위 100위에 서울대(38위)·연세대(50위)·고려대(61위) 등 3개 대학만 포함됐다. 반면 중국 10개(홍콩 5개 대학 포함), 일본은 4개 대학이 톱100에 자리했다. 특히 서울대는 2024년 31위에서 2025년에는 38위로 밀려났다. 서울대는 갖고 있는 모든 자원(훌륭한 연구 시설, 우수한 학생, 풍부한 연구비 등)을 갖고도 아시아 내에서도 이처럼 뒤처지고 있다는 점을 반성해야 한다. 지금은 연구와 교육 기관으로서의 서울대를 하나라도 제대로 만드는 게 급선무이다.
초중고 공교육의 붕괴, 그리고 최근 부산의 고등학생들의 자살을 초래한 교육 지옥은 서울대가 부족해서 발생한 일이 아닐 것이다. 우리 교육이 진짜로 바꿔야할 것은, ‘기회의 분배’가 아니라 ‘가치의 정의’다. 왜 우리는 다른 방식의 성공, 다른 가치의 삶은 상상조차 하지 않는가? 교육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과정이 아니라, 한 사회가 다음 세대에게 이상적인 인간형을 주입하는 방식이다. 지금 우리 교육이 재생산하고자 하는 인간상은 무엇인가? 진정한 교육 개혁은 ‘서울대’가 상징하는 가치에 대한 사회적 성찰에서 시작돼야 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열 개의 서울대가 아니라, 그 ‘신화’에서 벗어날 수 있는 용기다.
<본 칼럼은 2025년 7월 2일 경상일보 “[최진숙의 문화모퉁이(23)]열 개의 서울대, 하나의 신화”라는 제목으로 실린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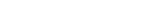

![[최진숙의 문화모퉁이(23)]열 개의 서울대, 하나의 신화](https://news.unist.ac.kr/kor/wp-content/uploads/2025/07/교육-가치-800x400.jpg)




![[매일시론] 이상한 나라의 대학](https://news.unist.ac.kr/kor/wp-content/uploads/2026/02/college-190x122.jpg)
![[경상시론]코닥 이야기: 성공의 열쇠, 성공의 역설](https://news.unist.ac.kr/kor/wp-content/uploads/2026/02/kodaq-190x122.jpg)
![[최진숙의 문화모퉁이(29)]‘두쫀쿠’와 ‘영블러드’](https://news.unist.ac.kr/kor/wp-content/uploads/2026/01/Dubai-Choco-190x122.jpg)
![[매일시론] AI가 의식을 가진다면](https://news.unist.ac.kr/kor/wp-content/uploads/2026/01/artificial-conscience-190x12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