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기업의 거의 전부는 중소기업이다. 흔히 ‘9988’이라 부른다. 기업의 99%, 일자리의 88%를 중소기업이 책임진다는 뜻이다. 중소벤처기업부가 8월29일 발표한 ‘2023년 기준 중소기업 기본통계’에 따르면 국내 중소기업 수는 829만8915개(전체의 99.9%), 종사자 비중은 80.4%, 매출 비중은 44.9%다. 우리 일자리와 지역의 활력, 수출의 밑변을 받치는 곳은 압도적으로 중소기업이다.
그렇다면 질문을 바꿔보자. 이 829만여개 중소기업 가운데 단 0.1%(약 8300개)만 혁신에 성공해 한 단계 도약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8300개의 ‘작은 거인’이 각각 100명의 양질 일자리를 늘리면 83만명의 새 일자리가 생긴다. 수출시장을 한 나라씩만 넓혀도 지역과 산업 생태계에 연쇄 반응이 일어난다. 막대한 재정을 쏟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작은 돈이라도 정확히 지원되면 파급효과는 예산 규모를 뛰어넘을 수 있다.
중소기업 정책의 정당성은 바로 이 “작은 지원의 큰 효과”에서 나온다. 문제는 어디에, 어떻게 쏟아야 하느냐다. 지난 8월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학자대회(World Congress of the Econometric Society, ESWC 2025)’에서 필자는 김준형(KDI), 이소연(존스홉킨스대)과 함께 ‘Are Exporters Naturally Hedged? Corporate Dollar Debt and Global Trade’를 발표했다. 5년에 한 번 열리는 이 대회는 경제학계 최고 권위의 ‘올림픽’으로 불린다.
우리 연구는 “수출기업은 환율에 강하다”는 통념이 평균의 착시일 수 있음을 보여줬다. 특히 중소 수출기업은 환율이 급격히 절하될 때 외화부채의 상환 부담이 커지며 생산이 위축되고, 수출 물량은 줄고 가격은 오르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아주 큰 기업들은 자금조달력과 시장지위를 활용해 물량을 늘리고 가격을 낮추며 충격을 상쇄했다. 즉 같은 환율 충격도 기업 규모와 재무구조에 따라 정반대의 결과를 낳는다.
정책의 방향은 세 줄로 요약된다.
첫째, 환율에 덜 흔들리는 생산 기반을 돕는다. 기본적인 위험관리 도구·정보 접근의 문턱을 낮춘다. 둘째, 유동성 끊김을 막는 상시 안전판을 둔다. 변동성이 커져도 생산이 멈추지 않도록 최소한의 백스톱을 갖춘다. 셋째, 초기 혁신과 첫 매출의 사다리를 놓는다. 작은 시도를 빠르게 실험하고, 초기 매출이 민간투자를 끌어오게 경로를 열어둔다. 여기에 기업 맞춤형 정밀진단(환율·원가·거래위험)을 더해 진단-처방-연결이 한 번에 이어지게 한다.
“재정은 유한하고, 도덕적 해이가 걱정이다”라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더욱 작게, 정밀하게, 성과와 책임이 분명한 설계가 필요하다. 핵심은 ‘많이 주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넣는 것’이다.
이번 통계는 또 하나의 신호를 준다. 중소기업 수와 고용은 늘었지만 매출 비중은 44.9%에 머문다. 파이는 커졌는데, 조각 하나하나의 두께가 얇다. 이 두께를 두껍게 만드는 고리는 환위험·유동성·첫 매출의 초입에 있다. 이 구간에서 1원당 한계효과가 가장 크다.
정책의 목적은 평균을 조금 올리는 게 아니다. 분포의 꼬리를 끌어올리는 것, 즉 0.1%의 도약 확률을 체계적으로 높이는 일이다. 혁신은 희귀한 사건이지만, 한 번 일어나면 주변 기업·부품사·지역 대학·연구소로 번지는 외부효과가 크다. 그래서 중소기업 지원정책은 복지의 덮개가 아니라 성장의 점화플러그다. 작은 스파크가 엔진을 깨우고, 그 엔진이 차를 움직인다.
중소기업 830만 시대, 정책은 ‘더 크게’가 아니라 ‘더 똑똑하게’여야 한다. 환율에 흔들리지 않는 생산, 첫 고객이 돼 주는 조달, 작은 돈으로 큰 실패를 허용해 더 큰 성공을 끌어내는 설계. 그중 단 0.1%만 제대로 불붙여도 한국 경제의 문장은 달라진다. 우리가 할 일은 간단하다. 작은 불씨를 꺼뜨리지 않는 것, 그리고 그 불씨가 커질 연료를 정확히 채워 넣는 것이다.
<본 칼럼은 2025년 9월 4일 경상일보 “[목요칼럼]0.1%의 기적; 작은 지원이 거인 中企 만든다”이라는 제목으로 실린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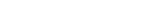

![[목요칼럼]0.1%의 기적; 작은 지원이 거인 中企 만든다](https://news.unist.ac.kr/kor/wp-content/uploads/2025/09/growth-800x466.jpg)




![[경상시론]코닥 이야기: 성공의 열쇠, 성공의 역설](https://news.unist.ac.kr/kor/wp-content/uploads/2026/02/kodaq-190x122.jpg)
![[최진숙의 문화모퉁이(29)]‘두쫀쿠’와 ‘영블러드’](https://news.unist.ac.kr/kor/wp-content/uploads/2026/01/Dubai-Choco-190x122.jpg)
![[매일시론] AI가 의식을 가진다면](https://news.unist.ac.kr/kor/wp-content/uploads/2026/01/artificial-conscience-190x122.jpg)
![[배성철 칼럼]30대 1 뚫은 ‘AI 인재’, 울산의 미래를 결정한다](https://news.unist.ac.kr/kor/wp-content/uploads/2026/01/talent-190x12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