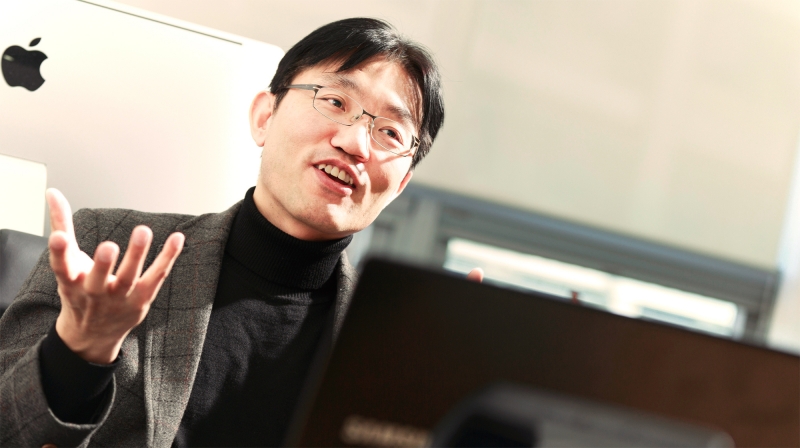“신소재공학과 의학은 서로 동떨어진 학문이라 같이 연구하는 사례도 드물었는데요. 오히려 다르기 때문에 뭉치면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최경진 신소재공학부 교수는 ‘융합은 동떨어진 분야끼리 해야 효과가 크다’고 생각하는 과학자다. 중첩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도움이 커진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지난 24일 고신의대와 협력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공동연구를 추진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최 교수는 “정통 신소재공학자는 질병에 대해 잘 모르지만 치료나 연구에 필요한 재료에 대해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다”며 “임상의사와 교류하다 보면 의료용 신소재 개발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대표적인 예로 관상동맥질환(CAD)을 치료하기 위한 ‘스텐트(그물망)’를 들 수 있다. 스텐트는 좁아진 혈관을 확장시키는 지지체의 일종인데, 수술로 삽입해서 혈액이 잘 흐르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 스테인리스 스틸로 만드는 스텐트는 한 번 삽입하면 혈관에 영원히 남는다. 이 때문에 스텐트 수술을 하고 나면 평생 혈전약을 복용해야 한다. 스텐트 주변에 혈전이 쌓이는 걸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최 교수는 “혈액에 잘 녹는 마그네슘에 다른 재료를 섞은 합금을 만들고, 이것으로 스텐트를 제작하면 일정 시간 뒤에 저절로 녹게 할 수 있다”며 “이런 재료가 만들어진다면 혈관 문제도 해결하고 수술 뒤 약을 복용해야 하는 불편함도 없앨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연구에 필요한 줄기세포를 더 잘 배양시킬 수 있는 재료도 함께 개발할 수 있다. 줄기세포가 어떤 환경에서 잘 자라는지 의사들이 파악하며, 그것에 적합한 재료를 신소재공학자가 개발하는 방식으로 협력이 가능하다.
실제로 진행 중인 프로젝트도 있다. 김칠민 DGIST 교수가 사업단장으로 있는 ‘극고품위값 마이크로디스크 레이저를 이용한 바이오 및 화학 센서 기술 개발’이다. 이 사업단에서 세부 과제를 맡고 있는 최 교수는 암 진단 센서를 개발 중이다.
최 교수는 “반도체 소자의 한쪽에 항원을 바른 뒤 혈액을 흘려주면서 항체와의 반응을 살피는 원리”라며 “반도체 소자에서 나오는 빛은 항원과 항체가 만나면 다른 파장을 내게 되는데 그것을 검출해 암을 판단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에서도 반도체 소자는 정통 신소재공학자가 다루고 다양한 항원-항체에 대한 지식은 의사들이 내놓는다. 그야말로 전혀 다른 분야의 사람들이 만나 시너지 효과를 내는 사례다.
두 연구 분야의 협력은 의료뿐 아니라 에너지 분야로도 활용될 수 있다. 우리 몸에서 얻을 수 있는 열이나 압력 등을 에너지로 변환하는 것이다. 최 교수는 “몸에서 나는 열이나 심장박동 등도 에너지로 활용할 수 있는 큰 자원”이라며 “열전효과나 압전효과 등을 이용하면 배터리 없이 동력을 만들어내는 장치를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이번 MOU에 따라 두 기관간의 워크숍을 정례화하고 소통할 기회를 많이 만들어 새로운 성과들을 만들어 낼 것”이라며 “융합의 효과는 서로 잘 알고 친해질수록 커지는 법이므로 자주 만나 소통하면서 창의적인 과제에 도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