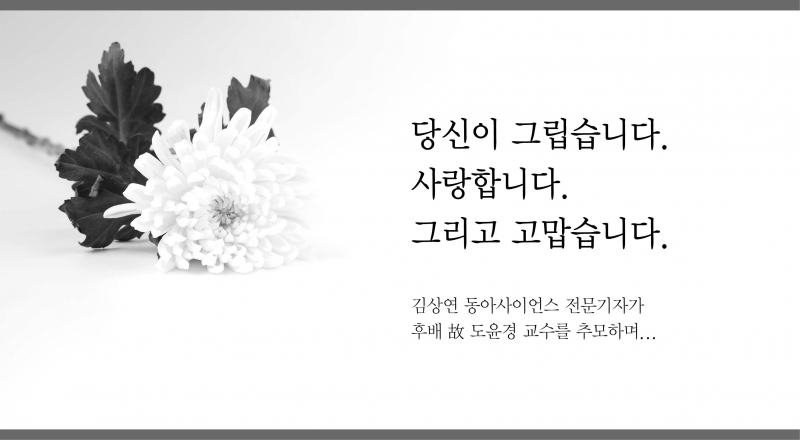도윤경 교수와는 1992년부터 1994년까지 같은 대학에서 3년 동안 같은 수업을 들었습니다. 군 휴학 덕분에 동기들보다 더 많은 수업을 같이 듣고 기나긴 실험으로 밤을 지새웠지요. 늘 “선배” 하며 똑부러지는 목소리로 인사하던 도윤경 교수가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지금도 4학년 마지막 해 도윤경 교수의 동기들과 오랜 시간 술자리를 하던 순간이 떠오릅니다. 그날 새벽 우리는 다같이 취한 상태로 시내를 걸어 학교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가장 취했던 후배가 도윤경 교수였습니다. 흔들리는 도윤경 교수를 돌아가며 부축했지요. 왜 그랬을까요. 졸업하고 다가올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4년 동안 자신에게 잘 버텨냈다고 격려하는 거였을까요.
졸업 후 소식은 잘 듣지 못했습니다. 저는 과학기자가 됐고, 몇 년 전 어느 날 유니스트를 취재하러 갔습니다. 다른 교수와의 인터뷰가 끝나고 방을 나와 엘리베이터로 가는 데 도윤경 교수의 이름이 보였습니다. 조심스레 문을 두들기고 들어갔습니다. 십몇 년 만에 근황을 듣고 어떻게 살았는지, 앞으로 무엇을 할 건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2년쯤 전 남편이 한 재미있는 연구가 있다며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짧은 뉴스가 과학동아에 나갔습니다. 그것이 도윤경 교수와의 마지막이 됐습니다.
참 잘 웃는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도윤경 교수가 있는 곳은 늘 시끄럽고 흥겨웠지요. ‘의리’를 아는 친구였습니다. 누군가에게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냥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씩 웃으며 당차게 도전하던 멋진 후배였습니다.
윤경아, 참 잘 버텨냈다. 포항에서 힘겨웠던 순간도, 그 후의 지난한 과정도, 그리고 짧았지만 유니스트에서의 교수 생활도. 늘 그렇듯이 삶은 우리 편이 아니지만 그래도 넌 썩 잘 해냈다. 이제 모든 짐 내려놓고 좋은 곳에서 편안하게 쉬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