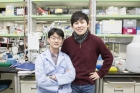“매달 새로운 기획을 하고 취재해서 글을 쓴다는 사실이 즐겁습니다. 평소에 궁금했던 연구 분야를 가까이서 볼 수 있고, 최고의 과학기술자들을 만나는 것도 영광스럽고요. 제가 즐거운 만큼 독자들도 과학에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기사를 쓰겠습니다.”
21일 UNIST에 송준섭 과학동아 기자가 방문했다. 그는 2010년 3월 UNIST에 입학해 2014년 2월에 졸업한 UNIST 2기 졸업생이다. 졸업 후 언론계로 진로를 잡고 준비한 지 4개월 만인 2014년 6월에 동아사이언스에 입사했다. UNIST 졸업생 중 최초로 기자가 된 인물이다.
7개월차 기자인 그는 “UNIST에 다니면서 여러 혜택을 받았고 그 경험들이 과학기자가 되는 데 큰 도움이 됐다”며 “실제로 과학기자가 돼서도 연구했던 경험은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말했다.
송 기자의 학부 전공은 생명과학이다. 학부 때는 박찬영 생명과학부 교수의 실험실을 찾아가 반장을 할 정도로 연구에도 몰두했다. 1년 반 정도 연구실 생활을 하며 실험 장비를 다루고 다른 학교의 연구실과 교류도 했는데, 이런 경험이 과학기자로 활동하는 데 도움 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박찬영 교수는 “송 기자는 처음 실험실을 찾아올 때부터 뚜렷한 목표가 있었고 성격도 밝아서 아끼는 학생이었다”며 “많은 분야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호기심도 많아 과학기자로서 잘 해낼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송 기자는 “재밌게 사는 게 목표인데 현재까지는 잘 이루고 있는 것 같다”며 “글을 써서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자신의 꿈을 밝혔다.
한편 동아사이언스는 2009년 설립된 과학콘텐츠 전문기업이다. 1986년 1월 창간한 과학동아는 월간으로 발행되는 국내 유일의 과학교양지다.
다음은 송준섭 기자와 일문일답
Q. 학부 전공이 생명과학이던데, 이 분야를 선택한 까닭이 있는지?
A. 어려서부터 역사에 관심이 많았고 그런 이야기들이 재미있었다. 그런데 생물이 역사와 비슷한 학문이다. 역사학자들이 땅을 파서 유물을 확인하고 과거의 사실을 밝혀내듯 생물학자들은 현미경 등으로 생물의 진화나 존재 원리 등을 알아낸다. 곡괭이나 삽 등이 현미경으로 바뀌었을 뿐 탐구의 원리는 유사하다. 그런 면에서 매력을 느꼈고 박찬영 교수 아래에서 직접 연구를 하기 시작했다.
Q. 박찬영 교수의 연구실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준다면?
A. 학부 때만 해도 해외 유학을 다녀와서 연구 분야로 진출할 생각이었다. 그러려면 논문을 써야 했고 지도교수가 필요했다. 마침 UNIST에 새로 부임한 교수가 있어서 찾아갔는데 그게 박찬영 교수였다. 연구실이 정비되는 단계라면 들어가서 할 일이 많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박 교수와 박사 후 연구원까지 셋만 있는 연구실에서는 뭐든지 빌리러 다니는 게 일이었다. 현미경도 갖추지 못한 작은 연구실이었지만 그 덕분에 더 많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었다.
연구실 생활은 꽤 재밌었지만 논문 쓰는 게 만만치 않았다. 다른 분야에 비해 생명과학은 연구 결과가 나오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린다. 1년 반이 지나도록 뚜렷한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답답했다. 학점까지 떨어지다 보니 연구실 나가는 게 힘들어졌다. 그래서 과감하게 다른 길에 도전하기로 했는데 그게 기자였다. 고등학교 때부터 기자나 PD에 관심은 있었지만 어떻게 준비하는지 몰라서 미뤄뒀었는데 그 길에 도전하기로 한 것이다.
Q. 기자 시험 준비는 어떻게 했나?
A. 무언가를 기획하고 표현하는 데 재능이 있다고 생각했다. 그걸 증명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YTN 라디오 공모전에 출품해서 입상도 하고, 서울에서 만난 친구들과 팟캐스트도 만들었다. 영화를 좋아해서 영화평론을 주제로 삼았는데 이 작업은 지금까지도 진행하고 있다. 언론사 입사 준비를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동아사이언스 공채가 떴다.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지원했는데 다행히 합격해 과학기자가 될 수 있었다. 언론사 입사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들었는데 운이 좋았다. UNIST에서 실험했던 경험과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갖고 표현하려던 게 주요했던 것 같다.
Q. 기자가 돼서 좋은 점은 무엇인가?
A. 매월 하고 싶은 일을 기획하고 그걸 해낼 수 있다는 게 가장 좋다. 평소 관심이 있었던 것들에 대해 최고 전문가들에게 들을 수 있다는 점도 영광스럽다. 7개월 정도 과학기자를 하면서 남들이 보도하지 않았던 걸 알아낸 적이 몇 번 있다. 에볼라 바이러스에 관해 취재할 때 치료제인 ‘지맵’에 관한 연구를 한 사람이 중앙대 고기성 교수라는 걸 알아내 글을 받았다. 이후 고 교수가 에볼라 바이러스 관련 다큐멘터리에도 출연하게 됐는데, 과학동아 기사가 계기가 된 것 같아 뿌듯했다. 최근 해커 출신 교수 1호도 만나봤는데 북한 인터넷망에 관해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이야기를 들려줬다. 이런 경험을 할 때마다 감사하고 독자에게 더 좋은 콘텐츠를 전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된다.
Q. 앞으로의 목표가 있다면?
A. 제 꿈은 ‘재밌게 사는 것’이다. 생물학 연구도 재밌었고, 과학기자로 사는 것도 즐겁다. 앞으로 어떤 길을 걷게 될지 모르겠지만 ‘재미가 있는 삶’은 변하지 않는 목표가 될 것 같다. 동아사이언스 면접 때 ‘10년 뒤에 무엇이 되고 싶냐?’는 질문을 받았는데 그 때 ‘소설을 한 번 써보고 싶다’고 대답했다. 무라카미 하루키가 자신의 수필집에서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이고 싶어서 소설을 쓴다’고 밝힌 적이 있다. 그러면서 한 독자가 그의 소설을 읽고 사랑하는 사람의 품으로 달려갔다는 일화를 소개했는데, 저도 그런 글을 써보고 싶어졌다. 제 작품으로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이 되고 싶다.
UNIST에 다니면서 여러 혜택을 많이 받았다. 학부생 신분이지만 연구실에서 실험도 직접해보고 고가의 첨단장비를 다루면서 다른 학교 연구자들도 많이 만났다. 그 밖에도 UNIST에서 얻은 기회들로 이만큼 성장한 것 같다. 그만큼 돌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고 훗날 어떤 방식으로든 갚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Q. 과학기자를 꿈꾸는 후배들에게 한 마디 한다면?
A. UNIST 출신이기 때문에 과학기자가 돼야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자신이 하고 싶은 게 일반적인 저널리즘인지 사이언스 저널리즘인지 스토리텔링인지 명확히 해둘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각 분야에 맞는 경험을 쌓는 게 좋겠다. 혹시 자신이 글쓰기 등에 재능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걸 증명할 수 있는 이력들을 쌓는 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로 사이언스 저널리즘에서 중요한 건 깊이를 설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어려운 과학을 쉽게 설명해야 하는데 얼마나 깊이 들어가야 하는지 기준을 정하는 게 가장 어렵다. 이 부분을 알아두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다.